민우소식지
[민우통신문 2023-2호] 누구의 시선으로 도시를 바라보는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6-30
- 조회 수
- 472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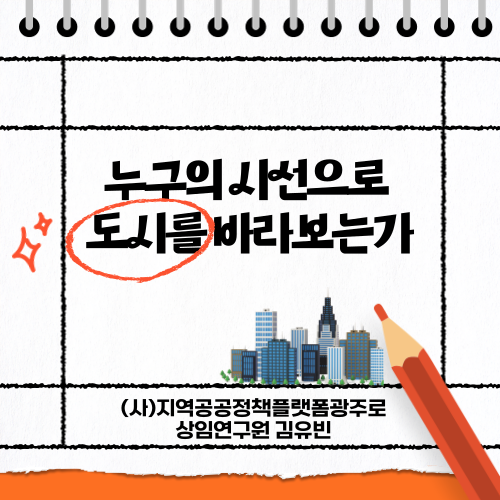
누구의 시선으로 도시를 바라보는가.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상임연구원 김유빈
내가 살아가는 도시에 나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던질 수 있을까? 우리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시선을 허락하는 도시일까? 안타깝게도 나는 이 두 질문에 ‘아니오’라는 답을 던지고 싶다.
2023년 5월 11일, 서구 양동 발산마을에서 북구 임동 전남·일신방직으로 향하는 광주천 위 ‘발산뽕뽕다리’가 완공되어 개통식을 열었다. 뽕뽕다리는 구멍 뚫린 철판 산업 자재를 다리로 활용한 것인데 방직공장에 출퇴근하는 여성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며 1975년 폭우에 휩쓸려 철거가 되었다고 한다. 올해 개통했으니 48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뽕뽕다리 개통에 관한 신문기사는 방직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애환과 추억이 담겨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기 마련이다. 실제 개통된 뽕뽕다리를 보고 추억에 잠기는 고령자분의 인터뷰를 보면 기획 의도에 맞게 작동하기도 하다. 그러나 뽕뽕다리를 설명하는 신문기사 중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마을 아이들이 호기심에 구멍 뚫린 다리 아래 누워 지나가는 여성들을 훔쳐보는 해프닝이 있었다.” 아이들이 여성들의 치마 속을 훔쳐보는 것이 호기심과 해프닝, 추억으로 소개된다. 도대체 누구에게 추억인가. 직선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는 성폭력이다. 그 당시에도 48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시선으로 이야기되는 일은 허망하다.
자연스럽게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 개발로 넘어가 보자면 광주시는 전·일방 부지의 “공장건축물 보존 기본원칙”을 세웠고 해방 전 설치된 공장건축물(제1·2 보일러실, 화력발전소, 고가수조)의 원위치 원형보존, 해방 후 설치 공장건축물에 대해 보존 순위 상위 11위와 기타시설물의 다양한 방식 보존계획을 사업자에 제안했다. 사업자는 2개의 역사문화공원을 통해 방직공장 관련 전시와 체험 및 문화학습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공장건축물을 보존하자는 것은 그 공간의 주체였던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기억을 함께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전문가 남성, 사업가 남성, 공직자 남성 사이에서 이야기되는 여성 노동자의 삶과 기억 여부가 어느 순간에 위화감이 들었다. 활동이나 사업을 함께하는 구성원 중 여성이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는 발언권이 있는 자들은 모두 남성이었다는 사실이 이 위화감을 반증할 것이다. 실제 전·일방 부지 관련 시의회 1, 2차 정책토론회 발제 및 토론자 12명 중 여성은 1명이었다. 약 9만 평의 부지를 개발하는데 그곳의 주체로 살아갔던 이들의 목소리와 발언권은 없는 것이다. (혹여 내가 모르는 공식적인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다.)
여담이지만, 일순 이런 생각도 든다. 7·80년대 한국 경제를 이끌었지만, 남성 노동자가 ‘산업화의 역군’으로 칭송받는 동안 ‘공순이’로 폄하된 사회의 시선에 자신을 감추고 나서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 아직도 폄하의 시선은 그대로라면, 여성 노동자의 재평가야말로 매우 시급한 일일 것이다.
비단 언급한 방직공장부지 뿐만 아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에서 대인동 성매매 집결지 재생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내까지 나가지 않아도 옛 시청사가 있었던 계림동만 해도 골목 골목을 들어가면 문 닫은 지 오래되어 보이는 맥양집을 볼 수 있다. 광주역 도시재생 예산 확보 현수막이 날리는 지금, 이대로라면 터부시하여 논의하지 않는 여성들의 공간은 아무렇지 않게 철거되고 사라질 것이다.
오늘 퇴근길에도 신호에 걸려 정차한다면 도로변에 있는 문 닫은 맥양집 두 곳을 볼 것 같다. 사실 두 곳을 발견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누구에게는 보이고,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는 공간들이 우리 도시를 구성하고 있다면 자신이 보지 못한 공간도 알 수 있게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발화하고 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삶의 공간을 기억할 수 있는, 모두의 도시가 되길 바란다.
